
[한잔만 더 마실게요] - 정승환
- Johnk
- 조회 수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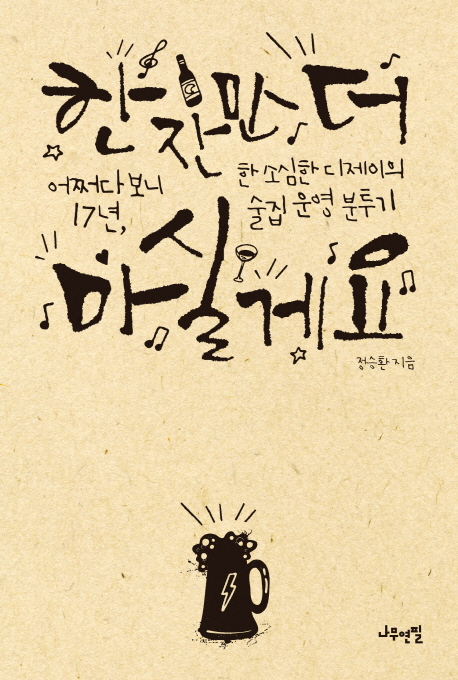
한 잔만 더 마실게요
어쩌다 보니 17년, 한 소심한 디제이의 술집 운영 분투기
정승환 지음 | 나무연필 | 2016년 10월 14일 출간 | 216P
D그룹의 부장 김병준씨의 별명은 ‘이거 차리려면 얼마나 들어요?’다. 그는 지방 도시의 칼국수집에서 혼자 칼국수와 만두를 시켜 먹다가, 두 명의 젊은 청년이 교대로 가게를 보는 커피숍에서 차림표를 훑어보다가, 와인 전문점을 흉내 내어 막걸리 종류를 바꿀 때마다 잔을 새로 갈아주는 막걸리 전문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거 차리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는 도망가고 싶은 것이다.
이런 남자들 가운데는 언젠가 돈만 모이면 회사를 때려치우고 엘피 레코드를 틀어주는 자그마한 술집 사장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이런 술집을 ‘록 바’ 또는 엘피 ‘바’라고 부르는 만큼, 이런 꿈을 가진 이들의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음악을 자신의 심장 박동만큼 사랑한다. 『한 잔만 더 마실게요』 (나무연필,2016)의 지은이 정승환도 그랬다. 청소년 시절부터 로큰롤을 좋아했던 그는 대학 졸업 후 영어학원 ․ 무역회사 ․ 컴퓨터회사 등을 전전하다가, 빠듯한 창업 자금으로 종로 2가에 열다섯 평 크기에 테이블 다섯 개가 들어가는 엘피 바를 차렸다. 이 책은 17년 동안 술을 팔고 음악을 틀었던 지은이의 술집 운영기이자, 음악과 술을 떼어 놓을 줄 모르는 단골들의 이야기다.
술과 로큰롤을 좋아했던 것과, 로큰롤을 하루 종일 트는 술집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더 말해서 뭐하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가혹하게 체험했던 것도 동경과 현실의 차이다. 엘피 바 사장과 현 대통령이 크게 다른 점이라면, 그 가혹함을 누가 겪느냐는 것이다. 술집 손님이야 그 집이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럴 수 없다. 모든 국가가 단골 술집이라면 국민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 수도 있을텐데. 사정이 이러므로 국민에게는 자격 없는 대통령에게 그만 두라고 말 할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주제에 괜한 시국 얘기가 앞섰다.
자신만의 카페를 꿈꾸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장사로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 많은 카페 주인들은 외진 골목의 망해가는 가게를 싸게 얻어서 손님을 끌어 모은 뒤, 권리금을 붙여서 파는 것으로 다년간의 고생을 상쇄하고 목돈도 손에 쥐고자한다. 하지만 다시 강조컨대, 소낙비를 구경하는 것과 소낙비를 직접 맞는 것은 다르다. 어떤 장사든 장사는 단골을 보고 한다는데, 허다한 동종 업소를 마다하고 손님이 내가 차린 가게의 상호를 기억하고 찾아오게 만들려면, 최소한 같은 장소에서 3년 이상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3년 버티기도 힘들다. 개업 첫 해의 을씨년스러운 풍경은 다음과 같다.
“초저녁 서너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들어오는 날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가게 앞에 더러운 물건이 버려져 있어서 손님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닐까, 아니면 간판 불이 꺼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든다. 궁금해서 밖에 나가보았다가 길바닥에 밀려다니는 행인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 한창 영업할 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방금 누가 마시고 나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빈 술병과 컵들을 테이블 위에 놓아둔 적도 있는데, 첫 손님을 기다리며 두 시간 동안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자니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다시 치워버렸다. 결국 오는 손님은 아는 사람들이다.”
지은이는 한 가게에서 세 번째 봄을 맞이할 때까지 현상 유지 밖에 못했다. 그 사이에 그가 상대한 것은 매달 돌아오는 월세와 장사 걱정이었고, 그런 큰 걱정에 비해 물이 세는 지붕과 거기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의 소란은 차라리 자질구레한 것이었다. 술집 주인이 월급쟁이보다 좋은 단 한 가지라봤자, 새벽같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지만 느즈막한 오후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새벽 5시에 닫는,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파탄이 나고, 건강마저 축이 나게 된다. 어쩌다 잔뜩 비관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지만, “나는 독자를 웃기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서문에 쓴 만큼, 이 책은 술꾼들과 록 애호가들의 특별하고 유쾌한 일화로 가득하다.
음악이 좋아서 엘피바를 찾아든 손님이기에, 각자의 음악 취향을 맞추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손님들이 어떤 노래에 반응하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기본이고, “유명한 가수의 명반을 고른 뒤,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피하고 마니아 취향의 숨은 명곡들을 위주”로 선곡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런 술집에서 “지미 헨드릭스와 에릭 클랩튼의 기타 연주 중 어느 것이 더 훌륭한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비틀즈가 럼주를 좋아했다”거나, 캐나다에서는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여자가 밴 모리슨을 틀면 같이 자도 된다는 뜻”이라는 따위의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문의 진원지도 바로 이런 술집이다.

영화 <High Fidelity>(한국 번역제목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의 한 장면
술과 로큰롤에 허우적거리는 남성들의 일상을 기록한『한 잔만 더 마실게요』는 가장 성공한 래드릿(lad-lit) 작가인 닉 혼비의『하이 피델리티』(media 2.0,2007)를 떠올려 준다. 닉 혼비의 소설에 나오는 음반가게(‘챔피언십 바이닐’)와 음반 중독자들을 정승환이 차린 앨피 바와 그곳의 단골로 바꾸면 얼추 분위기가 같아진다. 이들의 공통점을 닉 혼비의 말로 표현하자면, 더는 젊다고 할 수 없는 남자들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외로워’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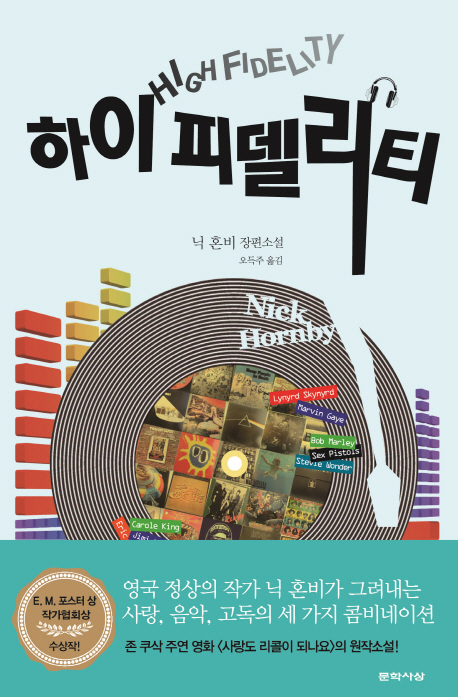
이들의 걱정과 외로움은 무척 낭만주의적이다. 현실에 충실하기보다 음반 수집과 알코올을 탐닉하면서 열아홉 살 때의 상태에 그대로 멈춰버린 이들의 태도는, 행복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성에 충실했을 때 이룰 수 있다며 모든 사회적 관습을 무시했던 고대 그리스의 키니코스학파(Cynics/Kynikos ․ 犬儒學派)를 닮았다. 그런데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하이 피델리티』와『한 잔만 더 마실게요』는 또 무척 다르다.『한 잔만 더 마실게요』는 재미있어서 필자의 취침 시간을 늦추었으나,『하이 피델리티』는 그야말로 독자들 잠들게 한다. 소설처럼 읽혔던 『한 잔만 더 마실게요』는 물론 소설이 아니다. 반면 래드릿으로 유명한 『하이 피델리티』는 문학적 쓰레기다.
- 책 표지.jpg (File Size: 275.8KB/Download: 72)
- x9788970129105.jpg (File Size: 282.6KB/Download: 72)
- 영화 하이 피델리티의 한 장면.jpg (File Size: 87.6KB/Download: 77)




